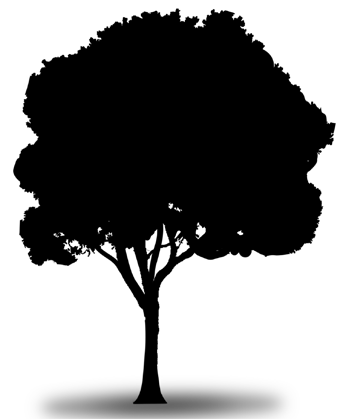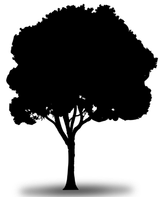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공생의 구조적 실패 (산지박)

2025년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 96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전체 647개 업무 시스템이 중단되었으며,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결코 우연하거나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 없다. 이 사건은 행정 시스템의 일시적인 중단을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공동체의 오랜 구조적 병폐와 총체적인 시스템적 안일함이 누적되어 초래된 '예고된 인재'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국가 핵심 인프라의 근간이 얼마나 취약했으며, 과거의 명백한 경고들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글은 이 중대한 사태를 역학적 관점과 현대 사회 시스템을 분석하는 공생 시스템 관점에서 비추어 보고자 한다.
무능과 안일함의 징후: '산지박(山地剝)'의 도래
주역에서 이번 사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괘는 23번째 괘인 산지박(山地剝)이다. 산지박은 괘의 가장 아래에서부터 음효(약한 힘, 부식) 다섯 개가 맹렬히 자라나 맨 위의 양효(강한 지도력) 하나를 깎아내려(剝)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을 상징한다. 이는 마치 산사태 직전에 산의 흙이 아래에서부터 벗겨져 나가 결국 가장 높은 봉우리마저 붕괴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기초가 부식되어 내부의 약한 힘이 강력한 지도력을 위협하는 시기를 뜻한다. 따라서 산지박은 겉으로 보기에 견고했던 시스템이 내부의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인해 근본적인 붕괴를 초래하는 시기, 즉 쇠퇴와 무능의 끝 단계에 놓여 있음을 극명하게 경고한다.

구조적 붕괴와 상구(上九)의 책임
산지박 괘가 경고하듯이, 겉으로 견고해 보이던 국가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의 근간은 이미 수많은 음효(부식의 힘)에 의해 잠식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이 '구조적 붕괴'로 나타났다. 이 사태는 무려 18년간 방치된 '단일 집중 구조(SPOF, Single Point of Failure)'라는 태생적인 구조적 취약성에서 시작되었다. SPOF(Single Point of Failure)는 시스템 내의 특정 부품, 소프트웨어 또는 요소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체 시스템의 동작이 붕괴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취약점을 의미한다. 즉, 쇠사슬에서 가장 약한 부분과 같아서, 이 부분이 끊어지면 쇠사슬 전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사건의 SPOF는 전국 핵심 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대전 본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다수의 전문가와 과거 행정망 마비 사태가 경고했듯이, 대전의 단일 장애는 국가 행정 및 민간 서비스의 전국적이고 동시적인 마비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취약한 구조가 빚어낸 결과는 단순한 데이터 훼손을 넘어선 국가 정보 시스템의 결정적인 '벗겨짐(剝)'이었다. 화재 조사 결과, 96개에 달하는 국가 주요 시스템은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 체계는 고사하고 서버·스토리지 이중화(Redundancy)가 '제로(0)' 상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여기에서 이중화(Redundancy)란 IT 시스템의 연속적인 서비스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내의 중요한 구성 요소나 전체 시스템을 중복으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즉, 똑같은 서버를 또 하나 구축해서 구동하다가, 하나가 다운되면 다른 하나로 서비스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러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시스템의 핵심 자산이 해킹은 물론 외부 재난에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G드라이브 서버 전소로 858TB라는 막대한 양의 기록이 영구적으로 소실된 것은, 공동체의 디지털 기억과 행정 기반마저 돌이킬 수 없이 깎여 나간 결정적인 쇠퇴의 증거이다. 이 데이터 손실은 산지박이 상징하는 붕괴의 현실적 표현이다.
이 쇠퇴하는 구조의 맨 위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은 상구(上九), 즉 가장 위에 있는 유일한 양효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국가 시스템 1,600여개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이자 시스템 안전의 최후 보루였으나, 아래에서부터 만연했던 부식과 안일함(음효)을 막지 못하였다. 결국 화재 당시 NIRS가 취한 647개 시스템의 전원을 모두 차단해야 했던 최종 조치는, 시스템의 관리 주체마저도 내부 붕괴를 막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지시킴으로써 재앙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상구의 역할 역시 마지막에 이르러 소멸하고 말았다.
시스템을 병들게 한 '공생의 트리플 실패'
NIRS 화재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물리적 결함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는 시스템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 원칙인 '공생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공생 시스템은 모든 구성 요소가 상호 의존하며 건강하게 유지되지만, NIRS의 경우 핵심 요소인 다양성, 환원,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세 가지 기둥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면서 전체 공동체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관료적 안일함이 결합될 때 맞는 파국이었다.
A. 다양성 실패: 가장 근본적인 원인 (평가: 최하위 등급)
공생의 원동력인 다양성은 위기 상황에서 유연성과 복원력을 발휘하게 하는 핵심적인 전략 자산이다. 이번 NIRS의 화재는 다양성의 부재 측면이 크다. 즉, NIRS는 단일 집중 구조(SPOF)를 18년간 방치함으로써 시스템 설계에 대체 경로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더욱이 화재로 중단된 96개 핵심 시스템은 이중화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시스템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조차 없었다. 즉, 모든 것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고 안일하게 운영한 결과였다. 다양한 바구니에 달걀을 여럿 담았다면 바구니 하나 놓쳤다고 모든 게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NIRS 서버의 다양성 부재는 이번 재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여, 붕괴를 가속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B. 환원 실패: 시스템의 자양분 고갈 (평가: 심각한 부적절성)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원은 단기적 이윤에 밀려 축소되었다. 이번 재난을 막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전센터 이중화' 예산을 61% 삭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노후 장비 교체 지연과 배터리 교체 권고 무시 등, 현명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스템의 자양분은 고갈되었다. 또한, UPS 배터리 분리 같은 중요 작업을 직원 6명의 영세 업체에 아웃소싱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하였으니, 이는 시스템 관리 품질 하락을 초래하는 '단기 이윤' 추구의 명백한 결과이다.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행정 경쟁력이 손꼽힐 때마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충실하게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투자했어야 했다. 우리는 많은 수혜를 디지털 인프라에서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얻은 과실을 넉넉하게 다시 돌려주지 못했다. NIRS 화재는 우리의 실수가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C. 리더십 실패: 수호자 역할 방기 (평가: 중대한 실패)
리더십은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했지만, 그 기능이 완벽하게 마비되면서 시스템 붕괴를 막지 못하였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과거 경고(2023년 행정망 마비)를 교훈 삼아 시스템을 쇄신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리더십 부재 속에서 재해복구(DR) 시스템 강화는 후순위로 밀렸고, 안전 투자가 아닌 단기적인 예산 통제와 안일한 판단으로 일관하였다. 문제는 이 것이 사건 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재 발생 후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및 중대본 가동까지 무려 12시간이 소요되는 등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투명한 지휘 체계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전체 공동체를 한 몸처럼 이끌어야 하는 리더십은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정확한 상황인식이 부족했다.
결론: 붕괴를 넘어선 '원점 재설계'만이 살 길
산지박 괘가 끝난 후에는 낡은 체제를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촉구하는 대로, 이제는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이 아닌 '국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근본적인 혁신을 단행해야 한다. 이 재설계는 단순히 장비를 교체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의 철학과 운영 원칙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대수술을 의미한다.
산이 땅에 붙어있는 것이 박(剝)이니, 위가 이로써 아래를 후하게 하여 집을 편안하게 한다.
象曰 山附於地 剝 上 以 厚下 安宅.
<산지박 괘상사>
산지박괘에서는 위에 남은 양은 아래를 두텁게 하여 집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집은 우리 사회이고, 그 집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두텁게 해야하는 '아래'는 사회 전체가 딛고 서있는 기본 인프라다. 동시에 그것은 모두 함께 공감하는 기본 원칙이자 철학이기도 하다.
상구는 큰 열매는 먹지 않는다.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집을 깎을 것이다.
上九, 碩果不食. 君子 得輿 小人 剝廬.
<산지박 상구 효사>
아래를 두텁게 하여 집을 편안하게 할 때, 소인이 아니라 군자라면 수레를 얻을 것이다. 수레는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공동체의 인프라이며, 공공의 재산이다. 디지털 행정에 비추어 보면, 아래를 두텁게 하는 것은 신속성과 기능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복원력을 시스템 설계의 핵심 원칙으로 천명하고, '액티브-액티브 DR(재해복구) 체계'로의 전환을 필수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전 본원의 단일 장애가 전체 마비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SPOF 구조를 영구히 해체하고 가상화 서버 및 데이터 스토리지의 다양화, 이중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중대한 실패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단기적 예산 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장기적인 안전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견고한 리더십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시스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편안한 집'으로서의 디지털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25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