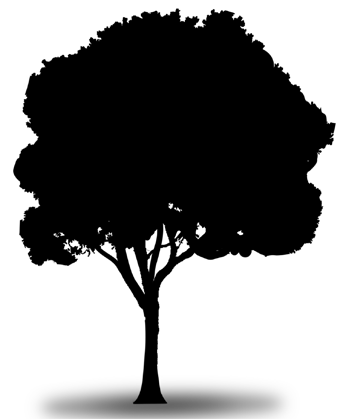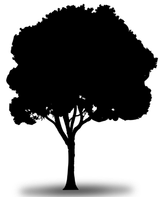그에게 '그다움'은 생명이다
다음 이야기는 장자 내편 응제왕의 마지막장 '혼돈'에 관한 것이다.
남해의 제왕이 있어 숙이라고 한다, 북해의 제왕이 있어 홀이라고 한다, 중앙의 제왕이 있어 혼돈이라고 한다. 숙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지극이 잘 대접하였다. 숙과 홀이 혼돈의 덕에 보답하기 위해 모의하기를 '사람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이 분만이 없다. 시험삼아 뚫어주자'. 하루에 구멍 하나씩 뚫더니 7일째에 혼돈이 죽었다.
-장자 내편 '응제왕'-
南海之帝為儵, 北海之帝為忽, 中央之帝為渾沌. 儵與忽時相與遇於渾沌之地, 渾沌待之甚善. 儵與忽謀報渾沌之德, 曰, 人皆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
숙과 홀이라고 남해와 북해의 제왕이 있고, 혼돈이 그 사이에 있는 중앙의 제왕이라는 점 그리고 숙과 홀이 중앙에서 때때로 만나고, 혼돈이 그를 잘 대접하였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역 괘의 음과 양을 떠올렸다. 숙과 홀은 모두 남과 북의 극단을 지배하는 주체이다. 음양으로 치면 숙이 양이라면 홀은 음이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 순음과 순양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양으로 상징되는 남자 역시 보통 여자들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음으로 상징되는 여자 역시 보통 남자들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추운 겨울에도 이른 봄날처럼 따뜻한 날이 있으며, 가장 더운 여름에도 싸늘한 바람이 불 때가 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현상, 모든 사물은 음과 양이 어느 정도 뒤섞여 나타난다.
혼돈이 숙과 홀의 중앙에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숙과 홀이 종종 중앙의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잘 대접하였다는 것은 음양이 뒤섞여 만물만사를 형성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인간과 같은 7개의 구멍을 뚫어주기로 한다. 인간이 가진 7개의 구멍은 양 눈, 양 콧구멍, 양 귓구멍 그리고 입을 의미한다. 이들 구멍은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눈이 코를 대신할 수 없고, 귀가 입을 대신할 수 없듯 구멍을 뚫는 것은 각 기능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분화시킨다는 것이고, 그것은 기능의 고정, 변화의 완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숙과 홀이 의논하여 구멍을 뚫었음은 주역에 빗대어 보면 음 또는 양으로 효가 결정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주역괘의 6개 효 그리고 하나의 동효 이상 7가지 포인트가 모두 고정되어 버린다면 시시각각 변모하는 변화의 이치를 온전하게 괘상으로 담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변화가 아닌 것이고, 역이 아닌 것이다. 그것은 역이 사라진 것에 다름 아니다. 즉 혼돈이 죽어버린 것이다.
혼돈이 가장 혼돈다운 것은 숙과 홀이 중앙에 모였을 때 있는 그대로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개의 구멍이 없음은 어느 곳이나 7개의 구멍이 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게 혼돈이고, 혼돈만이 가진 '그다움'이다.
혼돈이 그다움을 뺏겼을 때 더 이상 혼돈이 아닌 것처럼,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그다움'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그에게 '그다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25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