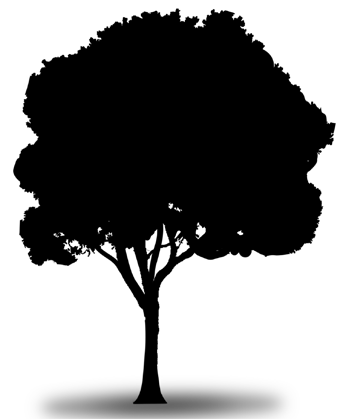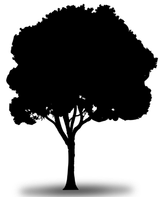[주역이 들려주는 12.3 계엄(3)] 민주주의에 막히다 (수뢰둔)
앞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무모한 '혁명'을 꾀하며 '택화혁' 괘의 지혜를 외면했음을 살펴보았다. 성급하고 준비되지 않은 반민주적 혁명적 시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그 파국이 남긴 것은 극심한 혼란과 정체, 곧 주역의 '수뢰둔(水雷屯)' 괘가 상징하는 난관과 혼돈의 상황이었다. '둔(屯)'은 풀이 갓 싹트기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마치 새싹이 땅을 뚫고 나오기 위해 힘겹게 몸부림치지만, 아직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형상과 같다. 12.3 계엄 사태는 바로 이 '둔'의 형국이었다. 어떠한 명분도, 정당한 절차도 없이 강압적으로 시작된 그 시도는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고, 그 중심에 선 지도자 역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명분을 얻었는가 아니면 잃었는가

'수뢰둔' 괘는 위에는 물(水, 감)이 있고 아래에는 우레(雷, 진)가 있는 형상이다. 이는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에서 천둥이 치는 것과 같아, 어려움과 위기가 겹겹이 쌓여 있는 시기를 나타낸다. 괘사는 “둔은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 가는 바를 두지 말고,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屯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라고 말한다. '둔'의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형통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잠재력은 있지만, 섣불리 앞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 가지 않는 대신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제후(諸侯)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는 경고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민주주의적이고 정상적인 소통 채널을 끊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유攸往', 즉 '나아가야 할 곳'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폭주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후(侯)'를 세우는 대신, '노상원 수첩'과 같은 비밀스런 계획으로 국민들을 배제하려 했다.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들은 '수뢰둔' 괘의 효사가 경고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맞물려 있다. 여기에서는 초구, 육사, 구오를 살펴보도록 하자.

초구, 머뭇거림이니, 바르게 거처함이 이롭고, 제후를 세움이 이롭다.
初九, 磐桓 利居貞 利建侯
반환(磐桓)은 머뭇거림을 말한다. 첫 효부터 어려움에 부딪혀 망설이는 상황이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저항과 시민들의 분노에 부딪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진격은 시작부터 막혔고, 이는 '나아가려다 막히는' 둔의 형국과 같다. 모든 일은 명분의 싸움인 법이다. 바르게 거처함이 이롭다는 것은 올바른 명분 위에서 행동하라는 뜻이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로 진격하라는 군 수뇌부의 지시에 명분이 실리지 못했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에게 막혀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것은 바로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육사, 말을 탔다가 서성인다. 혼인을 구하여 가면, 길해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六四, 乘馬班如 求婚媾 往 吉 无不利
여전히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앞 뒤로 옴쭉달짝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말을 탔으니 힘껏 달리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계엄군은 국회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완전히 막혔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혼인 뿐이다. 혼인은 화합이고 소통이다. 이 상황을 푸는 방법은 계엄군이 총구를 내리고 철수하는 길 뿐이다.

구오, 베품이 어렵다. 작은 일이면 길하지만, 큰 일에서는 흉하다.
九五, 屯其膏 小貞吉 大貞凶
오효는 임금의 자리이지만, 수뢰둔의 구오는 임금의 역할이 어려운 자리이다. 외괘가 감수로 어려운 상황이고, 내괘의 초효를 도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자리는 베풀어야 빛나는 법인데, 수뢰둔에서는 그 베품이 빛나질 않는다. 따라서 작은 일은 모르겠으나, 큰 일에서는 삼가고 또 삼가야 한다. 12.3 계엄은 우리 사회를 뒤흔든 현대사의 큰 사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노상원 수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사적이고 독단적인 욕망이 숨어 있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해프닝이라면 모를까, 국가의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큰 일에서는 길할 수 없다.
의로우면 보호받고, 의롭지 못하면 철저히 막힌다
수뢰둔 괘를 공생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 본다.
먼저 아래 두 사진을 비교해보자.


하나는 '2024. 12. 23. 여의도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는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나아가려는 자와 이를 막는 자들의 대결에 긴장감이 돈다. 다른 하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모습이다. 태아는 열달간 자궁 내 양수에서 모체와 탯줄로 연결되어 자란다. 이때 양수는 태아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한다.
두 상황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수뢰둔이 의미하는 괘상 측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계엄의 시도(하괘의 진괘)가 난관(상괘의 감괘)에 빠져 허우적되고 있는 것도, 태아(하괘의 진괘)가 따뜻한 양수(상괘의 감괘) 속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도 모두 하괘의 진괘(새싹, 새로운 시도, 꿈틀거리는 벌레, 움직임을 상징)와 상괘의 감괘(어려움과 곤란함, 물을 상징)의 구조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공생역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공생은 하괘와 상괘가 '다양성'과 '환원' 그리고 '리더십'에서 원만하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12.3 계엄'에서 하괘와 상괘는 서로 대치하는 관계, 즉 하괘의 시도를 상괘가 방해하는 모습이다. 상괘가 하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있으니 환원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결국 전체를 한 몸처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리더십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반면 '양수 속의 태아'에게 하괘와 상괘는 하괘의 시작을 상괘가 보호하는 모습이다. 하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본분을 다하고 있고(다양성), 상괘는 이를 보호하면서 하괘를 돕고 있다(환원). 상괘가 없으면 하괘 또한 생명이 유지될 수 없으니, 상괘와 하괘는 한 몸이나 다름없다(리더십). 전자가 공생이 실패한 경우라면, 후자는 모범적인 공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어떻게 하나의 괘상에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수뢰둔의 하괘에 있다.
지금 태어나는 새로움이 생명처럼 고귀한 것이면 안전하게 키워야 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부당한 시도이면 과감히 막아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명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효사의 설명과도 같다. 수뢰둔의 상황에서는 의로우면 보호받고, 의롭지 못하면 철저히 막힌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시도는 오직 한쪽의 힘으로 다른 한쪽을 완전히 억압하려는, 가장 극단적인 반(反)민주적인 행위였다. 그들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으로 억누르려 했다. 수뢰둔의 가르침은 정당하지 못한 시도는 결국 상괘인 감괘의 혼란함에 빠진다는 것이다. 12.3 계엄 역시 시작부터 혼란과 정체에 빠졌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오만한 독단은 공동체를 혼돈으로 몰아넣고, 결국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을 12.3 계엄은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모든 것이 미완의 상태로 남겨진, 다음 장의 '화수미제' 괘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5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