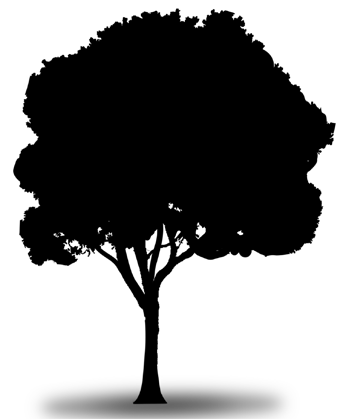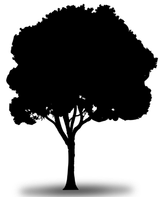'해야 한다' 말고 '할 수 있다'
최근 난 심각한 공허함에 시달렸다.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몸이 힘든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니다.
감정이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기력이 떨어진 것인지.. 그저 팽팽한 풍선의 바람이 빠진 느낌과 비슷한.
나는 '공허하다'는 단어가 그 상태를 비교적(완전히는 아니지만) 잘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 우울감과 비슷하지만 삶의 좌절을 느끼는 건 아니었다. 그저 혼자서 생각하고 싶었을 뿐.
공허함의 부작용은 무기력이다.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는 무언가 심적 동력이 사라진 기분은 무중력 상태에서 오도 가지 못한 채 뱅뱅 떠 있는 느낌이 들게 한다. 결국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무언가는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할 일은 쌓인다. 그것은 무기력은 개선하지 못한 채 주변인을 향한 짜증으로 바뀐다.
심각했다.
우리가 뷔페에 다녀와서 체했을 때, 무엇이 원인이었을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먹었던 음식을 하나씩 떠올려보는 것이다. 문제가 된 음식을 생각하면 온 몸이 반응한다. 속이 거북해지고, 뱃속이 더욱 막히는 느낌이다. 토하고 싶을 수도 있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온몸의 감각이 그 원인을 거부하는 것이다. 정말 효과적인 우리의 생존 본능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 공허함의 원인을 찾아본 결과, 난 과다한 '해야할 일들'로 인한 스트레스임을 알았다.
내가 챙겨야하는 일들. 내가 직접 해야하는 일들. 반드시 오늘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 다시 확인해야하는 일들. 살짝 떠올리기만 했을 뿐인데, 난 무기력과 공허함을 떠나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문제는 그 일들이 말 그대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임에 있었다.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도무지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답을 생각하는 일마저 '해야하는 일'이 되어 책임의 무게를 더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났다. 할 일은 더 쌓였다. 내 감정은 시한폭탄이 되어, 나 조차도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나 혼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렇게 점점 절벽으로 내몰릴 때 즈음, 내 머리를 잠시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사라진다해도 잘 굴러가겠지.
여전히 해와 달은 정확히 지구를 돌 것이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여름, 가을을 지날 것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 모두 누군가 나 대신 투덜투덜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 하루이틀 안한다고 해도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건 사실이다.
나는 그 동안 내가 '해야 한다'는 지독한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누군가로 너무나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안하면 또한 어떠한가. 세상이 망할 일이 아닌데.
내가 '해야 한다'고 여겼던 일들을 주욱 늘어놓고, '할 수 있는' 일로 바꾸어볼 수 있는지 생각해보았다.
'아이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차려줄 수 있다.'로 바꿀 수 있다. '취침 전 둘째 아이에게 자세 교정 스트레칭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취침 전 둘째 아이와 자세 교정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 날 있었던 이야기를 대화할 수 있다'로, '일주일에 한 번 세탁기를 돌려야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 이상 세탁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로 바꾸어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일의 총량이 줄어들진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책임과 의무가 나를 밀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권리가 되어 나를 이끄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음에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 그에 반해 '해야 하는' 일은 적어도 맥락 상에서만큼은 그럴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안하면 내게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가 된다. 하지만 그 일이 한 번 안했다고 내게 그렇게 벌 줄 일인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으면 안해도 되는 여유가 있다. 실제로 할 수 없으면 안해도 된다. 그래도 세상은 잘 돌아가니까.
나는 공허함 속에서 마치 익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대전제를 놓쳤던 것이다.
나부터 살리자.
나부터 살아야 다른 이를 살릴 수 있다.
공생에 앞서 자생이 필요한 이유다.
#250448